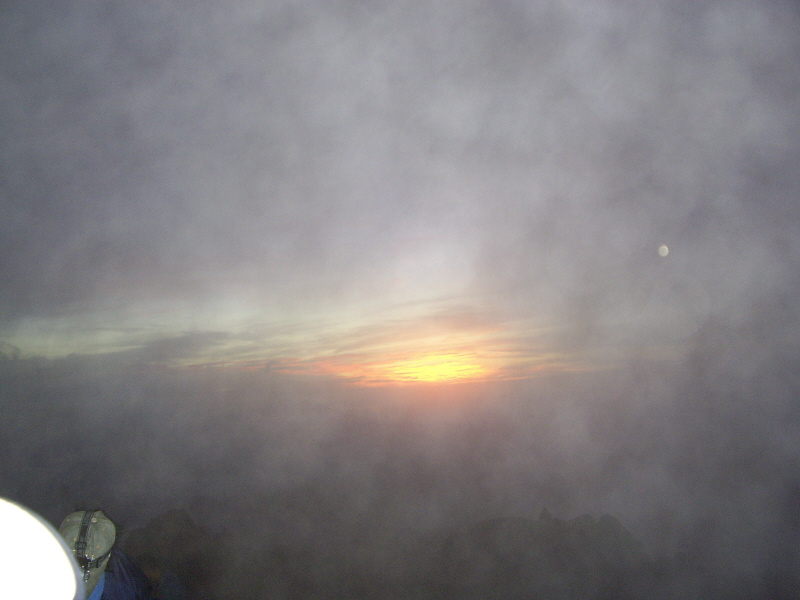들머리
7.31~8.2 사이 한메(지리산) 멧등을 타고(종주) 온 이야기입니다. 이 멧등타기는 백운대님이 얼거리를 짜서 길잡이로 이끌어 주셨고, 여산님 로맨티스트님 산돌이님 그리고 저 흰두루 이렇게 모두 다섯이 함께하였습니다. 그 사이 날씨가 아주 좋아서 비를 만나지도 않았고, 그 어렵다는 천왕봉 해돋이도 볼 수 있었으며, 멧등타러 간 우리들도 모두 아무 탈없이 처음 생각대로 끝마무리를 하였고, 돌아오는 길에도 서울가까이에 이르러서야 비를 만나 참으로 즐거운 메등타기가 되었음은 여러 해 동안의 날씨를 살펴 날을 잡은 백운대 대장님의 빈틈없는 얼거리짜기와 뒤에서 걱정해주신 우리바깥채(카페) 여러분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이 글을 쓸 생각도 아니 하였고, 처음에 간 사람이 어디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면서 함께한 분들이 한 제 써달라고 하여 다짐을 하였던 바라 씁니다마는, 읽으시다가 그만 두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한메오름글을 쓸 까리(기회)가 있다면 제대로 써 볼 생각입니다(아래부터는 하다로 씁니다).
찾아보니 지리산은 방장산이라고도 하고 두류산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모두 한자로 된 이름이고, 옛날에 우리말로 무엇이라고 했는지를 아직은 잘 모른다. 다만 노고단은 서라벌(신라)때부터 식게(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단”이란 말이 붙었고, 어떤이의 내세움으로는 크다는 뜻의 “한”과 “뫼”로 이루어진 “한뫼”가 “할매”로 바뀌고 이를 한자로 바꾸다 보니, 노고가 되었다는 것이니, 큰메라는 “한메”가 노고단이나 지리산의 처음 이름이었을 것이란 것이다. 앞으로 더 좋은 이름을 찾기까지는 한메라는 이름으로 지리산을 부른다.
한메가 좋다는 소리는 들은 지는 스물 몇 살 때, 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진지 오래 되었으나, 어찌어찌 해달만 가고 오늘에야 가게 되니, 설레는 마음으로 미르메참(용산역)에서 저녘 9:30에 만나기로 하였는데 8:40쯤에 다달았다. 이어서 백운대님과 로맨티스트님 그리고 여산님이 이르러 여수로 가는 22:50 긴수레(기차)에 몸을 실었다. 산돌이님은 벌써 노고단에 가 있고, 소풍님은 일이 있어 못 간다는 것이다. 새벽부터 오를 것을 생각하여 잠을 자려고 하나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구례구참에서 내려 제첩국으로 아침을 먹었다. 미리 맞추어 놓은 작은수레(택시)는 오지 않고, 밥집에 들어와 손님 끄는 분의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것저것 물어 보았다. 성삼재까지 가는 길은 1986해까지 닦였다 한다. 구례군은 울릉도 다음으로 작은 고을(군)이고, 사는 사람이 두 골(만)이 안 된다 한다. 구례구참은 순천시에 딸려서 여러 가지로 수나롭지 못하다 한다. 이 길은 찬내재(한계령) 못지않은 길로 오감사달(교통사고)이 많은 곳이고 큰수레(버스)가 탈이 많이 난다고 한다.
첫날 멧등타기
세집안이름재(성삼재: 마한은 변한과 진한이 손잡고 쳐들어옴에 맞서 달궁을 지키려고, 여기에는 집안이름[성]이 다른 세 사람의 장사를 두어 잣[성]을 지키게 하고, 정고개[정령치]에는 정장사 한 사람을 열덟사람고개[팔랑치]에는 여덟 사람의 장사를 두어 잣을 지키게 했으니, 집안이름[성]이 다른 세 사람의 장사가 지키던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에서 한메식게터(노고단)까지의 길은 넓게 닦아 놓아서 어둠 속에서도 불없이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둠속에 머릿불을 밝히고 한메식게터로 큰길을 따라 갔다. 가다 보니 작은 샛길도 있는데 좀 가파르다고 한다. 식게터에 오르니 좀 날이 번해져서 불을 끄고 둘레를 살펴보니, 저 아래 구름바다가 아름답기 그지없다.
거기서 산들이님과 만나 이제 물을 담고 멧등타기에 나선다. 찌검틀(사진기)이 모두 셋이었다. 나는 사람도 찍지만, 한메 날빛(경치)을 찍어 볼 셈으로 가져 왔다. 그러나 따라가기도 힘들고, 산돌이님이 내 찌검틀로 찍겠다고 해서 그렇게 맡겨 버렸다(그 때는 몰랐지만 산돌이님은 찍틀 셋으로 같이 찍게 되면, 나중에는 모두 밥이 떨어져 못 찍게 될 것을 내다보고 한 일이었다).
한메를 구경하는 일도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대충 줄거리를 잡고 하나하나 잔가지를 훑어 갈 수도 있고, 하나하나 잔가지를 훑어가다 보면 큰 줄거리와 온몸을 알아가는 길이 있으리라. 나는 큰 줄거리부터 알고자 처음으로 멧등타기부터 한 것이니, 이제에는 대강의 멧길을 익히는 것으로 넉넉하다. 그리해서 나중에 혼자라도 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때에는 작은 풀포기 나무 하나라도 꼼꼼히 살피며 서로의 만남을 뜻있게 하리라 생각하며, 짜여진 얼거리를 맞추려고 앞에서 서두르시는 백운대님을 따라 간다. 백운대님이 길을 잡고, 로맨티스트님 나 여산님 산돌이님 거의 이런 앞뒤(순서)로 오르내린다. 따라 가노라면 둘러 볼 겨를이 없다. 가다가 쉴 때에만 좀 숨을 돌리고 둘러본다.
백운대 이끄미님은 이 멧길에 처음 만났다. 찌검으로 미리 보았을 때는 느낌이 다부지고 키도 큰 걸로 생각했었는데,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으나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날라 다닌다. 임걸재(임걸령: 옛날에 임걸이란 옳은 일하던 도둑이 있던 곳이라 한다)에서 물을 다시 채우고, 집에서 올 때 긴수레와 새벽길에 추울까 입었던 긴팔과 긴바지를 벗어부치고, 짧은 것들로 갈아입는다.
노루목을 거쳐 슬기봉(반야봉)은 들르지 않고, 낫날봉(꼭대기의 바위가 낫날처럼 생긴데서 낫날봉이었으나 날라리봉 늴리리봉으로도 불리었다.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가 만나는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 삼도봉이다)에 이른다. 찌검틀 여닫개(셔터)를 몇 제째 누르고,
한메 등성이에 있는 저자터(장터)의 하나로, 경상도 연동골을 따라 올라온 소금과 바다낳이(해산물)를 전라도 뱀사골로 올라오는 삼베와 산나물 따위와 바꿨다는 화개재를 지나,
토끼봉(슬기봉에서 토끼쪽[새녘]에 있다하여 붙인 이름)을 거쳐, 연하천(무슨 뜻 인지 모름) 비킴곳(대피소)에 다달아 낮밥을 10때(시) 좀 지나 먹었다. 여기 다다르기 앞서 꽤 긴 나무서다리(계단)를 내려 왔다(550서다리). 내려오는 길이라 어려운 줄 몰랐지만 거꾸로 오르려면 얼마나 힘들까? 꼽슬국수(라면)와 지어 파는 밥을 함께 넣고 끓여서 처음 먹어본다.
아침을 3때 가웃쯤 먹었으니 이른 것은 아니다. 설거지는 안 된단다, 종이로 닦아 챙겨 넣고 쉬다 물을 채우고 떠난다. 이곳은 무엇을 더 짓는지 한 참 일을 하고 있다.
길을 떠나면서 무거운 등자루(배낭)를 메고 그 봉우리들을 오르내리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 오니 그런 걱정은 사라지는 것 같다. 뾰족한 바위 둘이 좀 높거니 낮거니 마주 서 있는 맏아우봉(형제봉)을 지나고,
꽤 낮은 곳에 자리잡은 푸른하늘재(벽소령)는 밝은 달빛(벽소명월)으로 이릌난 곳이라 한다. 벽소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다. 이 글을 쓰면서 찾아보니, 벽공과 같은 뜻으로 나온다. 이렇게 잘 쓰지 않는 어려운 됫글(한자)말들로 이름을 붙여 놓으니, 나리들이 그 뜻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벽소령 벽소령하니 참 딱한 노릇이다.
푸른하늘재를 지나 선비샘에 이르니 이제는 지친다.
백운대 이끄미를 바짝 따다 붙다가 이제 좀 사이를 두고 간다. 이제는 일곱 꿈내(선녀)가 노는 것 같다하여 이름하였다는 일곱꿈내봉(칠선봉)을 지나, 검맞이봉(영신봉, 우리말로 검 곰이 신의 뜻이라 함)으로 오른다. 검맞이봉을 오르는 나무서다리가 가파르고 높직하다.
지금까지 쌓인 지침에다 이걸 만나니, 지리산이 민우리말로 무엇인고? 생각하던 것이 지루하다는 지리한 메? 다른메와 다르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메? 남다른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빼어난 날빛이 지루할 순 없고, 그러나 몸이 힘든 데는 그런 모든 것이 쉴 곳에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에는 지루할 수도 있겠다. 어서 빨리 쉴 곳에 닿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나무서다리 가운데에 쉬어 갈 수 있게 긴 나무걸대(의자) 둘을 마주 보게 놓았다. 거기에 쉬고 있던 가시버시(안팎)와 함께 주저앉아 기운을 차리고 올라갔다. 검맞이봉에 오르니 이제 오늘은 더 오를 곳이 없다는 것이 기쁘다. 짧은 바지를 입으니 시원해서 좋은데, 너덜길을 가다 돌에 부딪혀 한두 군데 다치게 되는 것이 아쉽다. 힘이 부칠수록 부딪히기 쉽다.
여기까지 오는 길에 만난 사람들 가운데 안팎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주치면 서로 한마디씩 반갑다든가 아늑하냐든가 힘내라든가 애쓴다든가 상냥하게 아는 척하는 일이 잦다. 네델란드에서 왔다는 흰둥이도 만났는데, 스무살 먹었고 우리나라에 온 지 두 달 됐다고 하는데, 아주 좋다고 것이다. 우리말도 얼마쯤은 하는데 홀로 왔는지 같이 붙어 있는 사람은 못 본 것 같다. 우리나라 메도 널리 온누리에 잘 알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여,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잘 살펴볼 일이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 안개나 구름에 가려 보지 못하는 봉우리가 없이 모두 제 몸을 드러내 맞아 주어서 참으로 고마웠다.
잔돌비킴곳(세석대피소)으로 가는 길은 앞에 두 분은 벌써 앞서 갔고, 뒤에도 사이가 벌어져 홀로 호젖하게 걸었다. 너른잔돌밭(세석평전)을 바라보면서 메에 오른다는 것이 무었인지 왜 오르는지 생각해 본다. 비킴곳에 다다르니 4때 20난이다. 너른잔돌밭은 이현상의 남부군이 둥지를 틀었던 곳으로 이름난 곳이라 한다. 그때 이 곳에서는 남부군의 큰모임과 놀이가 열렸었다 한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둘러싸여 떼죽음을 맞았던 피비린내 나는 발자취를 가진 곳이 바로 이 너른잔돌밭이란다. 세집안이름재(성삼재)에서 길 떠난 지 12때새(시간) 만이다. 다른 분들은 꼽슬국수로 저녁을 들고, 나는 지어논밥을 김치와 함께 먹었다. 메리(미국)의 미친소 끌탕 뒤로 물고기와 남새(채소)를 먹고, 소고기가 들어가는 것은 먹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다음날 날씨가 비가 150즈믄남저자(미리)쯤 온다고 했단다. 날씨가 나쁘면 하늘임금봉(천왕봉)에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고 한다. 여기까지 와서 하늘임금봉도 못 올라가는가 걱정이되고, 내려가는 길을 어디로 잡아야 아늑할지? 골짜기 물이 많지 않은 곳을 잡아야 할 것이란 생각들을 이야기했다. 산돌이님의 도움으로 잠자리를 아늑하게 할 수 있었다. 나는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그러나 드러눕자마자 코를 골며 잘 주무시는 분도 있다.
둘째날 멧등타기
다음날 새벽 두 때쯤 인지 백운대님이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떠, 짐을 꾸리고 하늘임금봉을 바라고 떠난다. 날은 캄캄하고 바람은 몹시 몰아친다. 비를 만나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요새는 우리나라에도 토네이도란 회오리바람이 나타난다고 한다. 엄청 불어대는 바람을 맞고 보니, 그런 회오리바람 생각도 난다. 메에 오르다 회오리바람에 날리는 것은 아닌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가며 올라가야 하는가? 바람의 힘을 깨닫는다. 비가 무섭고 불이 무섭다. 그러나 바람은 더욱 무섭다는 생각이 여기서 처음으로 든다. 바람은 구름을 날려 비를 몰고 오지 않는가? 어마어마한 물을 실어 곳곳에 뿌려준다. 캄캄한 가운데 산돌이님이 촛대봉을 지난다고 한다. 세검봉(삼신봉) 연하봉(무슨 뜻인지 모름)을 지나, 저자터목비킴곳(장터목대피소)에 이르러 등자루를 내려놓고 쉰다. 물도 다시 채워 넣는다. 저자터목비킴곳에서 제석봉(부처가르침에서 나온 말로 마땅하게 고치기 어렵다) 하늘임금봉까지는 참 가파른 곳이다. 하늘임금봉우리에 다다르니 5때 20난 안팎이었던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와서 자리를 잡았다. 나도 꼭대기를 바라보고 맨 오른쪽 틈새에 자리를 잡았다. 지금 생각하니 거기도 좋은 자리였던 것 같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오고 있었다. 홀로 떨어져 있었으므로 함께온 이들을 찾으려고 왼쪽으로 나왔더니, 백운대님과 로맨티스트님을 만났다. 서서 해돋기만을 기다리는데, 앞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해돋이를 찍기에 어렵다. 사람들의 머리가 나오는 것이다.
등 뒤쪽에서 불어대는 바람은 구름을 몰고 들이닥친다. 해 오를 쪽이 벌겋게 해가 나올듯하다가 몰려드는 구름에 부옇게 된다. 이러기를 되풀이 하니 오늘은 글렸다는 소리가 나온다. 좁은 꼭대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누가 해돋이 보겠다고 자칫 몸을 가누지 못해 넘어지거나 밀거나 해서 큰 사달이 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된다. 해돋는 때가 5때 가웃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한다. 백운대님이 내려가자고 한다. 그래서 셋 이는 조금 내려왔다. 여산님과 산돌이님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 내려와 기다리다 로맨티스트님이 찾으러 다시 올라갔고, 나는 거기서 왼쪽으로 해 솟는 곳이 조금 보이는 쪽으로 갔다. 어떤 사람이 그런다 집에서도 볼 수 있는 해를 뭐하러 그렇게 보려고 애쓰느냐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해가 솟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고 놀랍고 기뻐서, 외마디 소리들을 절로 낸다.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이런 겪음을 바라고 사람들은 몰려올 것이다.
산돌이님이 올린 찌검을 보고 놀랐다. 돋는 햇빛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것 말이다. 메에 오를 때, 메를 잘 아는 사람과 함께 오르는 것, 찌검을 잘 찍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찰김(복)받는 일일 것 같다. 모두 함께 만나 저자터목비킴곳으로 내려가면서 산돌이님이 그런다 "나는 천왕봉에서도 해 보고, 집에서도 해 본다" 고. 저자터목비킴터에서 아침을 먹고, 무당골(백무동)쪽으로 길을 잡아 참샘 하동바위를 거처 무당골 큰수레참으로 내려왔다. 산돌이님이 잘 아는 지리산 반달곰팬션식당이란 밥집에서 몸도 씻고, 닭죽으로 낮밥을 먹고, 서울로 가는 큰 수레에 몸을 실었다.
마무리
한메의 곳곳 이름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됫글말로 되어 있어, 알기 쉬운 우리말 옛날에 썼던 우리말로 다시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억지로 바꾸어 보려고 했지마는 더 좋은 말들을 찾아 부르기 좋고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말들로 바꾸어야 한다. 잉글말에 파묻혀 배우기(영어몰입교육)를 한다느니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마운틴”이 널리 쓰이고, 마운틴을 풀이하면 “산”, 산을 풀이해야 “메”라는 우리말을 만날 수 있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메는 뫼에서 바뀐 것이고, 뫼는 모이가 줄어서 된 것인가? 모는 바닥과 바닥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꼭지다. 따라서 땅이 솟아 모가 된 곳이 모이 -> 뫼 -> 메 로 되고 사람들이 만나는 것도 모이는 것이고, 모이면 먹으니까 먹는 것도 모이 뫼 메가 되어 진지의 뜻을 가지고 또 짐승에게 주는 것도 모이가 된다?
오감이 쉽지 않았던 때에는 머나먼 곳을 돌아가는 것 보다는 지름길로 질러가는 것이 오히려 쉬웠을 것이므로, 한메의 조금 낮은 고개마다 저자가 서서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따위를 바꾸었을 것이다.
요즘에 메에 오르는 까닭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몸이 물러 튼튼하게 하려는 사람, 목숨을 건 짜릿함을 느끼러 가는 사람, 아름다운 날빛(경치)을 즐기러 가는 사람, 사람을 사귀러 가는 사람, 깨우치러 가는 사람, 높은 것이 있으니까 간다는 사람(제 발 아래 두겠다는 생각?), 가슴속에 쌓인 짜증을 풀러 가는 사람, 남이 가니 따라가 보는 사람.... 어떻게 버리었든(시작했든) 그 까닭은 또 바뀔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나로 뭉뚱그린다면, 나를 찾으러 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튼튼한 나, 즐기는 나, 보다 센 나, 참나 더 나아가면 온누리와 하나되는 나까지!
함께 한메의 등성이를 죽 타는 즐거움을 누렸던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드리고, 생각지 않았던 글을 쓰게 하시어 한메 멧등타기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아무 탈없이 다녀오기를 빌어주신 바같채 여러분, 남달리 짐을 가볍게 하라고 귀띔을 해주신 꼭지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메타고 나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갓메(관악산)를 타고(9/27) (0) | 2008.09.28 |
|---|---|
| 미리내인메(한라산)를 다녀 와서(9/19-21) (0) | 2008.09.24 |
| 구름걸린메(예봉산) 멧등타(9/6) (0) | 2008.09.07 |
| 닷대메(오대산) 작은쎈쇠(소금강)를 다녀 와서(8/23) (0) | 2008.08.25 |
| [스크랩] 수리메를 오르고 나서(8/10) (0) | 2008.08.19 |